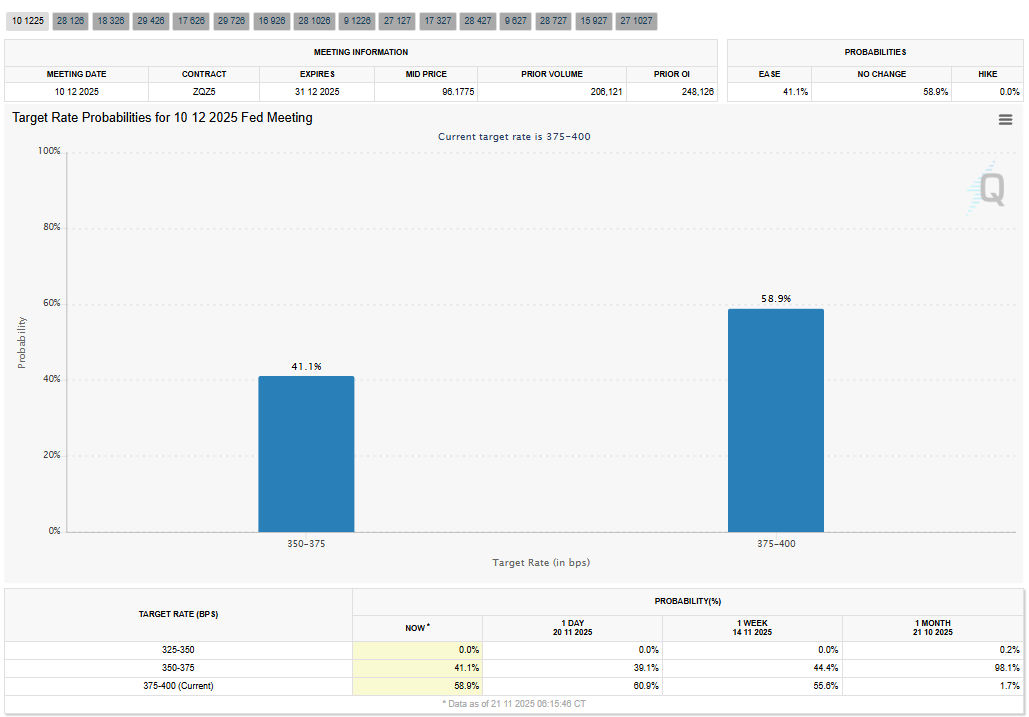1. 이번 코인 사이클의 마무리는 경제 충격과 맞물릴 것으로 봄.
2. 단순 비관론, 겁주기가 아니라 참 공교롭게도 많은 것들이 얽히고 섥혀있음.
3. 이번 내용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함. 갑자기 거시경제를 깊게 들여다보려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많을 건데, 공유드릴 방법이나 기회가 더 있다면 나도 좋겠음.
4. 원래 가벼운 글들을 여러 개 쓰고자 했는데, 준비하다보니 욕심이 나서 퀄리티가 자꾸 올라감. 대중적으로 공개하기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이해하시는 분들만 이해하고 아닌 사람들은 그냥 넘길 걸 알고 있기에 풀어봄.
5.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불장의 흐름을 잘 탄 다음, ‘자산을 시스템 밖으로 빼내야 한다.’ 무슨 말이냐?
6. 비유하자면 파티를 잘 즐기되 남들보다 좀 더 일찍 파티장을 나서는 것, 파티장을 나설 때 칩을 다른 자산으로 치환하는 것. 을 생각해야 함.
7. 왜 그런지 풀어보겠음.
8. 미국은 세금으로 걷을 수 있는 재정에 한계치가 존재함. GDP 대비 세금 수입은 대체로 15~20% 사이로 유지됨.
9. 이것보다 많이 걷으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세수도 감소하게 됨.
10. 재정적자를 무한정 늘릴 수 없으니 정부는 더 많은 지출을 위해 세금 이외에 다른 카드를 사용할 수 밖에 없음.
11. 결국 선택되는 수단, 지금까지 잘 작동해왔던 수단은 부채와 통화 발행.
12. 세금으로 부족하면 정부는 빚을 냄. 이 빚은 GDP 대비 90%를 넘기면 회복이 어렵고, 120%를 넘기면 사실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제학계의 일반적인 견해.
13. 지금 미국은 어떨까? 이미 120%를 넘은 상태이며, 역사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정점을 찍었던 수준.

14. 세금 더 걷을 수 없고, 빚은 이미 넘쳐나고, 그 다음은? 통화 발행을 늘림. 잘 알고 있는 양적완화(QE).
15. 최근에는 금값을 재평가해서 통화 발행 여력을 확보하겠다고도 함.
16. 미국은 현재 알려진 바, 2억 6,150만 온스의 금을 보유 중임. 장부상으로는 온스당 42달러로 적용되어있는데 이를 시가(3,300달러) 수준으로 재평가하면 1조 달러에 가까운 공짜 돈이 생김.
17. 세금 인상, 빚 발행, 통화 발행도 아닌 제4의 방법. 회계 트릭 같지만 틀린 말은 아니고, 하지 말라고도 못함. 하지만 사실상 돈 찍기 효과.
18. 실제로 1934년 루즈벨트 시절에도 금을 온스당 20달러에 강제 매입하고, 가격을 35달러로 올려서 ‘정부 자산을 뻥튀기 → 대공황 시절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양아치 짓을 함.
19. 이번에도 원리는 같음. ‘법적 선언’만으로 돈이 생김. 이번에는 비트코인 법안과도 연결됨. 재무부가 금을 재평가하면 연준은 차익을 정부에 송금해줌.
20. 정부는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인다는 구상. 베센트 재무장관은 ‘우리 비트코인 안사ㅎㅎ’라고 발언했다가 ‘매입 확대 검토하겠다’며 다시 물러섬. 시장은 혼란.

21. 확정은 안났으나 관건은 금 재평가와 실제 실행될지, 차익을 어디 쓸 것인지에 달림. 이게 단행되면 달러 신뢰는 더 떨어지고, 금과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날뛸 수밖에 없음. 주요 이슈 중 하나이니 각자 팔로업해봐도 좋음.
22. 금 재평가와 관련된 시나리오는 3개 정도 있는데.. 여기 풀면 너무 길어지니 패스.
23. 돌아가서, 미국 정부는 재정 적자를 해결할 방법이 막힘. a) 세금 더 걷기? 어려움, b) 채권 더 찍기? 부채비율 부담스러움, c) 양적완화? 인플레이션.
24.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 가지 수가 있는데, 바로 금융 억압.
25. 정부가 국민의 자산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며 국가 부채를 줄이는 전략인데, 1945년~1980년 미국은 이 방식으로 국가 부채를 해결했음.(위 그래프 참조)
26. 당시 국민들의 자산은 주식보다 현금, 채권이 많았고, 금은 보유 금지였음. 대부분 국민은 인플레이션에 무방비로 노출됨. 마이너스 수익률을 겪음
27. 가령, 연간 인플레이션은 6%인데 예금 금리가 2%라면 자산이 매년 4%씩 깎이는 셈, 달러 가치가 매년 4%씩 줄어들면, 정부 입장에서 갚아야할 부채를 더 쉽게 갚을 수 있는 셈.
28. 다시, 오늘날 미국은 GDP 대비 부채비율이 120%를 넘어섬. 트럼프 정부는 이를 잘 알고 있고, 해결하기 위해 금리를 계속 낮추고, 통화 공급을 계속 늘리고 있음.
29. 표면적으로는 금융 억압과 좀 다를 수 있음. 과거와 달리 금을 사고,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해외에 자산을 이전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같은 방향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
30. 애국심, America First, 국가 안보 등을 외치며 해외 자산 이동을 제한하거나
31. 공무원 연금, 401k 등을 통해 국채를 강제로 사게 만들거나
32. 금&비트코인 보유를 제한하거나(강제보단 세금 혜택 등으로 유도하지 않을까?)
33. 어찌되었든 과거와 다르지만 현대 사회는 기록, 추적이 용이함. 다 전자로 기록되기에. CBDC라는 디지털 화폐가 등장하면? 추적과 통제는 더 쉬워짐.
34. 금융 억압이 진행되면 주된 피해는 ‘중산층’에 집중됨. 고소득층은 이미 해외에 자산을 분산했거나, 금과 비트코인 처럼 시스템 밖의 자산을 보유함.
35. 금융지식이 부족할수록 국내 은행의 예금, 연금, 채권에 자산을 묶어둠. 연 1%, 2%. 우리가 은행 창구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무슨무슨울트라캡짱AI글로벌짱짱맨펀드’처럼. 실제로 어르신들은 아직도 많이 가입함.
36. 결국 정부는 조용한 세금이라 불리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자산 가치, 구매력을 줄이고 정부의 부채를 감축함.
37. 여기서 주목해야할 건? 지금의 금값과 비트코인 상승은 이런 억압 정책을 시장이 스스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흐름일 수 있음.
38. 과거에 데인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 밖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함. 금 실물을 사서 보관하거나, 비트코인을 콜드월렛에 저장하거나..
39. 상황이 이렇게 되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돈 버는 능력’임. 이전 글에도 밝혔듯 경제는 어려움. 어려워하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어렵게만 느껴짐.
40. 하지만 1940~1980년대 미국에서 국민들이 죽어나간다 해도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잘 벌었음. 미친듯한 성장, 부의 창출? 당연히 있었음. 워렌 버핏은 이 시기에도 꾸준히 투자 수익을 냈음.
41. 모든 자산이 사라지더라도, 내 돈을 다 빼앗기더라도 능력이 있으면 부는 다시 쌓을 수 있음.
42. 이게 진정한 ‘시스템 밖 자산’.
결론 : 미국 정부는 GDP 대비 부채비율 너무 높음. 해결하려고 안간힘 씀. 관세 협상, 금리 인하 압박, 금 재평가, 국채 발행 등등. 이는 곧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이어짐. 불장이 끝나더라도 달러 가치 하락은 이어질 수 있음. 시스템 밖의 자산을 준비해야 함.

![[비트] 68800깨지고 내려온다면..](https://cointree.kr/wp-content/themes/Extra/images/post-format-thumb-text.svg)